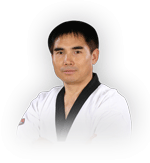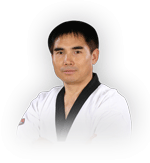
YouTube 영상 보기는 아래 유투브 영상 보기를 클릭하세요
虛實篇(허실편) 32강 “손자는 물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신성환
손자병법 여섯 번째 편인 虛實篇(허실편) 각론이 “손자는 물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각론으로 끝납니다. 손자병법에서 유명한 편중에 하나가 虛實篇편이라고 했는데 허실편을 마치면서 손자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토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론(토파)한 31편의 각론 된 내용을 다시 간략하게 상기해 보겠습니다. 첫 편이 뭐였습니까? ‘시계편’ 이었습니다. 계산하라 입니다. 그 다음이 ‘작전편’으로 전쟁을 준비하라 였고, 다음이 공격 준비를 하라는 ‘형편’이었습니다.
그 다음 ‘허실편’에서 형과 세를 키우고 상대방의 허와 실을 파약해 공격을 하라고 합니다. 손자병법 전체 13편중 이 ‘허실편’을 기점으로 상편과 하편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각론은 ‘허실편’의 마지막 각론으로 “손자는 물에서 무엇을 보았는가?”를 마지막으로 ‘허실편’을 끝내고 손자병법 하편(후반부)으로 들어갑니다.
허실편의 마지막 각론은 “손자는 물에서 무엇을 보았는가!”입니다. 손자가 주장하는 핵심은 물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대는 물과 같아야 한다고 선언을 합니다.
‘물’ 도대체 손자가 물에서 무엇을 봤기에, 물이라고 하는 것에서 어떠한 느낌을 받았기에 군대라고 하는 조직이 물과 같아야 한다고 선언적으로 말을 하는지, 오늘 각론주제로서 손자는 과연 물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에 대해서 토파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물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사람마다 느낌이 다 다를 것입니다. 물을 보면 빨래하고 싶은 생각부터 각자가 다양하게 본인이 관심 있는 것과 연계된 생각(행동)이 날 것입니다.
시원하게 흐르는 냇가에 가서 빨래하는 것을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고, 물의 특성인 잔잔함 속에서 마음의 평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등 각 개인이 느끼는 생각은 다양할 것입니다.
손자가 살았던 당시에 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느낌은 손자뿐만이 아니라 노자, 공자, 장자 등 많은 제자백가들이 물에 대해 느낀 뭔가를 말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 각론에서 그러한 주장(생각)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손자가 살던 시대에 다른 철학자들은 물에서 무엇을 봤는가? 그것이 오늘 각론 핵심 주제입니다. 공자는 황하 유역에 살았습니다. ‘황하(黃河)’는 중국대륙 서부에서 북부로 흐르는 강으로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강입니다.
지도이미지삽입

서부 산악지대에서 발원 해 산동반도 끝으로 나오는 물줄기인데 그곳 곡부라는 곳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황하에 자주 갈 기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논어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逝者如斯夫 不舍晝夜(서자여사부 불사주야)”라고.
황하에 가보셨습니까? 황하라고 하면은 뭔가 가슴이 울렁거리는 중국의 유명한 강으로 중부지방을 관통하는 물줄기로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황하를 배경으로 많은 말을 한 관계로 ‘황하’하면 뭔가 엄청난 것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필자는 황하에 아주 오래전(2000년도)에 처음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황하는 산동성 제남이라는 도시 위를 흐릅니다. 황하는 도시보다 높이 흐릅니다. 왜냐면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최초에 강줄기 옆에 둑을 쌓아서 도시를 보호 했는데 서부 사막지대에서 흘러내리다 보니 강바닥에 흙이 자꾸만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강둑을 더 높이 쌓아야 도시를 보호 할 수 있다 보니 도시가 강바닥 보다 더 낮은 곳에 위치하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도시는 강바닥보다 아래에 있고 황화는 도시 위로 흐르는 모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황하를 구경하려면 강둑 위로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물이 도시보다 위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 황하라고 하는 곳에 필자가 처음 가서 황하를 본 느낌은 뭐야! 유명한 황하 란 것이 이런 거야, 뭐 흙탕물이 흐르는 그냥 그런 강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황하를 딱 바라보는 순간 왜? 흙탕물이지 하는 실망감이랄까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황하에 대해서 나름 평가하는 말을 많이 한 관계로 필자 생각에 뭔가 신비스럽고, 아주 맑고 물에 신비로움과 웅장함이 있는 강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거 뭐 누런 흙탕물 밖에 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공자가 황하에 가서 했던 이야기 “逝者如斯夫 不舍晝夜(서자여사부 불사주야)”라는 말 등 많은 사람들이 황하에 대해 한말들에 의해 뭔가 대단한 것이 황하라고 생각 했는데 누런 흙탕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 말입니다.
공자가 강가에 서서 말하기를 "흘러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밤낮을 멈추지 않는 구나" "逝者如斯夫不舍晝夜(서자여사부불사주야)"라고 시간의 흐름을 말한 것을 상상하고 그에 버금가는 뭔가가 있을 것이란 느낌을 갖고 갔기 때문에 필자는 황하가 대단한 것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본 황하는 그런 상상을 깬 흙탕물만 보이니 말입니다.
공자가 말한 상황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逝(서) 갈 서자입니다. 거 있잖습니까? 서거했다 어느 분이 돌아가셨을 때(죽음) 가셨다고 하잖습니까? 갈서 입니다. 아주 시적입니다. 그러니까 황하를 바라보면서 아! 흘러가는구나!
저 황하의 강물이 낮과 밤을 쉬지 않고 흐르는 구나라고 하며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뭔가 느낌을 말한 것입니다. 황하를 바라보면서 시간의 도도한 흐름을 말하는 그런 논어의 구절을 떠 올리면서 공자가 황하를 보면서 느낀 세월의 흐름인, 흘러가는구나, 저 도도한 황하의 물결이 밤낮을 쉬지 않고 흘러가는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 느낀 것입니다.
공자는 황하에서 뭘 본 거예요? 황하의 흐름에서 시간의 흐름을 본 것입니다. 마치 인류의 역사가 흐르는 황하처럼 흘러가는 시간의 도도한 느낌을 본 것입니다. 황하라고 하는 강물에서 그 어마어마한 인간 역사의 도도한 물줄기를 본 것입니다. 그런 느낌을 갖고 필자도 황하에 갔는데 황하가 완전히 흙탕물로 흐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황하를 본 느낌이 거 뭐라고 할까요? 참 거시기한 답답하다고 할까 뭔가 신비스럽고 뭔가 웅장하고 하는 그런 느낌이 순간 확 없어진 것입니다. 차라리 안 보는 것이 나았을 텐데, 그냥 가슴 속으로 논어에 나오는 "逝者如斯夫 不舍晝夜(서자여사부 불사주야)"의 느낌만 갖고 있었던 것이 나을 뻔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공자는 물에서 뭘 봤어요? 흘러가는 시간을 보았고 역사의 흐름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황하에서 본 것이 다 다릅니다. 공자는 황하에서 시간의 역사를 보았고 노자는 ‘순응’을 봤습니다.
노자는 물에서 많은 것을 봤지만 ‘순응(적응)’을 봤던 것입니다. 사실 노자만큼 물에 대해서 많은 느낌을 가진(본) 철학자도 드뭅니다. 노자의 도덕경을 쭉 읽어보면 결국은 물처럼 살란 이야기입니다.
‘水’ 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 동그란 그릇에 담기면 물은 어떻게 변하죠? 동그란 모습을 하고,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 모양을 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순응하는 삶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절대로 높은 곳을 향해 오르지 않습니다. 낮은 곳, 아래로 밑 골짜기가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다 바위가 있으면 잠시 머뭅니다.
그러다가 그 바위를 살짝 돌아 비켜 흘러갑니다. 너 안 비켜, 이렇게 흐르지(살지) 않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며 양보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세상(천하)에 물 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없습니다. 물은 자연에서 가장 약합니다. 그렇지만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단단하고 강한 것을 공격하면은 ‘莫之能勝(막지능승)’이라 어느 누구도 능히 그것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영등포에 철공소 있잖습니까? 오래전 스테인레스 철판을 가공할 일이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철공소에서 두꺼운 쇠를 자르는데 물을 이용해 잘랐습니다. 그 강한 철판은 물이 있어야 잘려지는 것입니다. 철을 자르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물이 강한 힘을 발휘할 때는 그 어느 누구도 당해내지 못합니다. 낙수 물이 떨어지면 결국은 단단한 바위에 구멍을 뚫어내잖습니까? 그게 뭐예요? 천하에 가장 유약한 듯 보이지만 그 물이라는 것이 단단한 것을 공격했을 때는 그 무엇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물은 자연계에서 가장 약하고 부드럽지만 가장 강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노자는 바로 그것을 물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지금 각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자는 물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공자는 황하에서 긴 세월과 역사의 흐름을 봤고, 노자는 부드러움과 약함 속에서 최후의 강함을 봤고, 또 한 자연에 ‘순응’하는 겸손을 보았던 것입니다.
당시 많은 제자백가들이 모두들 물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명심보감에 보면 “君子之交淡如水小人之交甘若醴(군자지교담여수소인지교감약예)”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석하면 “군자의 사귐은 담박하기가 물과 같고, 소인의 사귐은 달콤하기가 단술과 같다”입니다. 군자가 사람을 사귀는 방법은 담박하다는 것입니다. 담박하다는 것이 뭐예요? 싱겁다는 것입니다. 싱겁다는 것은 맛이 없는 것이잖습니까?
즉 진정한 사귐은 물처럼 맛이 없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습니까? 그런데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맛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맛있는 거, 처음엔 맛있는데 두 번 세 번 계속 먹으면 아무리 맛있는 것도 질립니다. 진짜 아름다운 사귐은 담담합니다. 싱겁단 말입니다. 마치 물처럼, 그렇지만 오래 갑니다.
그런데 소인들이 사귀는 방법은요? 그냥 달콤한 감주 같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사귐은 물처럼 아무 맛도 없지만 그러나 오래 가는데, 소인들의 사귐은 아주 달고 맛있는 단술과 같습니다.
동양적 사고로 봤을 때 사람들의 사귐을 물과 같이 인간적인 아름다운 사귐에 비유한 것입니다. 당장은 쇼킹(호들갑)하지도 달콤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영원히 지속되는 사귐을 본 것입니다.
공자, 노자, 장자, 명심보감 등 동양 철학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물에서 철학(사상)을 끌어낸 것입니다. 그럼 필자가 제기한 문제, 과연 손자는 물에서 무엇을 봤는가가 오늘 각론 주제입니다. 손자는 물에서 무엇을 봤는지 손자병법 원문을 통해서 토파해 보겠습니다.
손자는 물에서 이런 것을 봅니다. ‘부병형상수(夫兵形象水), 수지형(水之形), 피고이추하(避高而趨下). 병지형(兵之形), 피실이격허(避實而擊虛). 수인지이제류(水因地而制流), 병인제이제승(兵因敵而制勝)이라고 합니다’.
대적하는 군대 모습(형)은 어떤 모습입니까? 즉 손자가 말하는 군대 모습(형)은 물과 같아야 한다고 합니다. 위 문장을 해석하면 “무릇 용병은 물과 같아야 한다. 물은 높은 곳을 피하고 낮은 곳으로 흐른다. 군대의 운용도 적의 실한 곳을 피하고, 약한 곳을 공격해야 한다. 물은 지형에 따라 그 흐름이 결정되고, 군대의 운용도 적의 상황에 따라 승리가 결정되는 것이다”
손자는 군대의 모습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강한) 군대는 물과 같은 군대라고 아주 선언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상선약수(上善若水)’라고 합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뜻으로, 노자의 도덕경 8장에 나오는 사자성어입니다.
상선약수(上善若水)라 함은 물의 성질을 본받으라는 말(주장)입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무르며, 도(道)에 가깝다고 하여, 최고의 선의 표본으로 여깁니다.
물처럼 남과 다투지 않고, 겸손하며, 유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상적인 삶의 태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상선약수’라 하는 것은 물 이름이 아닙니다. 상선약수라 함은 기여도(기여함)입니다.
노자 도덕경에 물의 속성에 대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고 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만물을 이롭게 해줍니다. 이롭게 해주는데 절대로 다투질 않습니다.
또 물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곳, 그곳으로 흘러내려 갑니다. 사람들은 어딜 가장 싫어해요? 낮은 곳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물은 그 낮은 곳으로 내려(흘러)갑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간단 말입니다.
물은 진정한 ‘무위의 도’에 가까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은 남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흘러 내려갑니다. 물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물 만큼 세상에 이로운 존재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물은 온 세상 만물을 이롭게 해주면서도 그게 내공이야, 너희들은 나 때문에 사는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은 온 세상을 아름답고 이롭게 해주지만 자기의 공을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남과 공을 다투려 하지 않기 때문에, 물은 영원히 모든 만물의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자는 군대의 모습은 물과 같아야 한다고 하면서 물에서 뭘 봤냐면 유연함을 봤습니다. 유연함! 유연하다는 것이 뭐예요? 상황에 따라서 자기를 변화 시키고 적응시키는 유연함의 아름다움을 본 것입니다.
손자는 물과 관련해서 허실편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水之形避高而趨下(수지형피고이추하)’라고 합니다. "무릇 군대 진영은 물과 같아야 한다. 물의 모습은 높은 곳을 피(우회)하여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손자는 물에서 또 무엇을 봤냐하면 겸손함을 봤습니다. 앞에서는 유연함을 봤습니다. 군대는 뭐와 같아야 한다고 했어요? 물과 같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물이 흐름에 있어 장애물을 만나면 옆으로 피해 흐르듯이, 상황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연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손자는 물에서 무엇을 봤냐면 ‘避高而趨下(피고이추하)’ 즉 물은 높은 곳을 피하고 낮은 곳으로 흘러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 모습도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물과 같아야 한다고 했잖습니까?
군대 모습은 물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야 군대도 어디를 피하고 어디를 공격해요? 실한 곳을 피하고 허한 곳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군대는 물과 같아야 된다. 왜냐하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군대도 물과 같아야 하는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은 강한 곳을 피하고 약한 것을 치(공격)라는 것입니다.
손자는 물에서 겸손함의 미덕을 본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도 그 지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의 미덕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聰明思睿(총명사예) 守之以愚(수지이우)", 총명과 예지가 뛰어 나더라도 그 총명함을 지키는 것은 어리석음으로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지혜가 보석처럼 반짝이며 빛을 내더라도, 그것을 오랫동안 지키기 위해서는 어리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명하고 생각이 깊고 예지스러워도 그 총명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守之以愚(수지이우)’ 어리석은 사람처럼 행동해야 내 청명함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공이 천하를 뒤덮을 만하더라도 그 공을 남에게 양보하고 남에게 그 공을 미루었을 때 그 공을 내가 진정 지켜나갈 수 있다. ‘용력진세’ 내 힘과 용기가 온 세상에 떨칠만해도 그것을 지켜나가려면 마치 내가 겁쟁이인 것처럼 해야 용기와 힘을 지켜나간다.
내가 돈이 아무리 많고 천하의 부를 다 쥐었어도 그것을 지켜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검소함으로 남에게 겸손하고, 부자로서 자기 부를 지켜나가려면 절대로 화려한 옷 입고 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진짜 힘센 사람은 남한테 야 너 이리와 봐 라고 완력을 쓰지 않습니다. 항상 공손하고 자기를 낮춥니다. 손자는 결국 물에서 무엇을 본 것입니까? ‘피고추하’ 높은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겸손함을 본 것입니다.
그런 물의 순응을 보고 손자는 군대도 결국은 저 물처럼 겸손할 때, 높은 곳을 피해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듯이 실한 곳을 피해서 허한 곳을 칠 때 진정한 군대의 힘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말을 물과 관련해서 합니다. “수인지이제류(水因地而制流)”라고 강조하는 이 말이 허실편의 백미입니다. 군대는 계속해서 물과 같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병인제이제승(兵因敵而制勝)”이라고 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형에 따라 모습이 바뀐다. 물은 앞에 놓여 진 지형을 따라 물줄기를 만들어냅니다. 즉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이해되시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형이 푹 파여진 곳이면 파여진 대로 흘러갑니다. 즉 앞에 있는 지형에 따라 자기를 순응시키며 흘러갑니다. 손자는 군대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무엇에 기초해서요?
적의 상황에 따라서 승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물이 자기 앞에 있는 상황(지형)에 따라 흐름과 물줄기를 만들어내듯이 군대도 상대방(적)의 상황과 형세(모습)에 따라서 대적을 하므로 승리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전제 한 이야기가 뭐였어요? 군대는 물과 같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손자는 물에서 군대가 승리를 하기 위해 취해야 할 많은 행동수칙(양식)을 본 것입니다.
물을 보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앞에 있는 지형에 따라 자기를 완전히 순응(적응)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모습은 군대가 승리하기 위한 군대 모습이란 것입니다.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물과 같이 유연함을 보이고 전력이 우위에 있어도 불구하고 겸손함으로 상대방에게 배려(양보)하는 그런 물의 모습이 군대의 모습이어야 승리를 할 수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故兵無常勢(고병무상세)水無常形(수무상형)’라는 말을 합니다. 군대 모습은 적의 형세에 따라 변화하므로 일정한 형세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로 “무릇 군대 형태는 물과 같아야 한다.
물은 높은 곳을 피하고 아래로 흐른다. 군대의 형태도 적의 충실한 점을 피하고 허점을 공격해야 한다. 물은 지형에 따라 흐름의 형태가 정해진다. 군도 상황에 따라 승리의 방법을 통제하여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군대의 형태는 언제나 유동하고[故兵無常勢], 물도 언제나 고정하는 법이 없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변화하며 승리를 획득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군대라고 하는 것에서 영원한 기세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각론에서 토파했습니다. 군대라고 하는 것도 항상 세가 좋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세가 강할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단 말입니다. 영원한 세가 없듯이 물도 뭐가 없는 것입니까? 영원한 모양이 없는 것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처한 환경(상황)에 따라서 모양(모습)이 변합니다. 물을 그려보라고 하면 어떻게들 그립니까?
자기 상상력대로 그리지 않습니까? 어항 속에 있으면 물의 모양은 어향 모양이 될 것이고, 흐르는 강물이면 강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모양이 없는 것입니다.
군대라고 하는 것도 영원한 세가 없는 것입니다. 승리도 영원한 승리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도 영원한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 시절(어린시절) 앨범을 한번 보세요. 나의 영원한 모습이 뭐예요?
낭랑 십팔 세 버드나무 밑에 있는 소녀의 모습이 내 영원한 모습입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세월에 따라 나의 모습을 적응시켜왔잖습니까? 물처럼 순응하며 지나가는 세월! 난 그거 못 참아, 끝까지 소녀 모습 지킬 거야 하면서 아주 발버둥을 치시는 분들 많습니다.
나는 절대로 세월에 내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겠다고 적금만 타면 어디로 가요? ㅎ
손자병법 ‘허실편’ 마지막 구절은 물과 같아야 한다고 하면서 영원한 勢는 없다. 영원한 승리는 없다. 영원한 모습도 없다. 결국 우주의 모든 상황은 다 끊임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허실편’ 각론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장자에 나오는 ‘애태타(哀駘它)’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애테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애틋합니다. 이름만 봐도 얼마나 못생긴 사람인지 짐작이 갑니다. 위나라 사람입니다. 당시 위나라에서 가장 못생긴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애태타’입니다.
추남 중에 추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과 조금만 이야기를 나눠보면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빠져드는 것입니다. 참 희한합니다.
특히 젊은 여자들은 이 사람을 만나서 조금만 이야기를 하면 집에 가서 부모에게 나 다른 집에 시집가서 정실 처가 되는 것보다도 이 사람(애태타) 첩이 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하는 여자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지위가 높아서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다른 사람을 가난에서 구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모든 남자와 여자들이 모두 이 사람만 보면 같이 있고 싶어 하고, 이 사람 여자가 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며 노나라의 ‘애공’이 공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애공(哀公)’은 노나라의 군주(제27대)입니다.
‘애공’이 애태타에게 사람들이 끌리는 이유가 뭘까? 라는 궁금함에 애테타를 궁전으로 불렀습니다. 도대체 무슨 매력이 있을까?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얼굴도 못생긴 이 사람에게 한 1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애공 마음이 슬쩍 애태타에게 끌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 년이 지나니까 아유! 이 사람 없으면 하루도 못 살 거 같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노나라의 재상 자리가 비어있던 터라 내가 당신한테 국무총리 자리를 주겠다고 했더니만 애타타가 시쿤둥하게 주면 받고 하는 표정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말을 한 ‘애공’이 숙스러워졌습니다.
거! 있잖습니까? 선물을 아주 기가 막히게 준비해서 상대방이 아주 좋아할 줄 알고 이거 내가 당신한테 주는 거요 라고 줬는데 그래 주는 것이니 받죠 라고 하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선물로 공치사 하려했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워져요.
이해되시죠? 위 상황은 노나라 ‘애공’이 공자한테 애테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상자리를 줬는데도 뭐 별로 반기지 않고 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궁에 없는 것입니다. 애태타가 사라지고 난 후부터 애공은 밥을 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 정말 세상에 재미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라고 공자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답을 합니다. 공자가 하는 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애테타에 관해서 하는 말!
공자 왈! 내가 오래전에 초나라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초나라에 가다 보니까 길거리에 돼지 한 마리가 있는데 거기에 새끼돼지들이 젖을 빨고 있습디다.
그런데 어미 돼지를 자세히 보니까 어미 돼지는 이미 죽은 돼지였습니다. 그런데 새끼 돼지들은 쭉쭉 젓을 빨다가 갑자기 엄마가 죽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씩하고는 새끼 돼지들이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장자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 새끼 돼지들이 자기의 엄마! 즉 어미돼지를 사랑했던 것은 그 어미의 형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새끼 돼지들이 어미를 그토록 사랑하고 젖을 빨았던 이유는 “愛使其形者也(애사기형자야)”라는 것입니다.
해석하면 ‘외형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내부의 근본적인 것, 마음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란 것입니다. 즉 외형이 아니라 마음인 것입니다. 새끼 돼지들이 그 어미돼지를 사랑하고 그 옆에서 젓을 빨고 있던 것은 엄마 돼지의 겉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엄마돼지의 겉모습을 만들어낸 엄마라고 하는 느낌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우리는 어떤 것들을 바라볼 때 대부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잖습니까?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겉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나에게 부모(엄마)라고 하는 느낌으로 다가오니까 겉모습 이전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공자가 말하는 것은 ‘애테타’라고 하는 사람은 겉모습 형체가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남자, 여자들이 애테타 애테타 하며 선호했던 것은 결국은 겉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뭐를 사랑(좋아)했던 것입니까? 물과 같이 자기주장(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항상 다른 사람과 동화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애테타를 모두가 좋아했던 것입니다.
필자가 물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에 많은 철학자들이 물에서 본 예를 들었습니다. 특히 손자는 무엇을 봤습니까? 손자는 물에서 겸손함과 적응(순응)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물처럼 주변 상황에 적응하는 유연함을 물에서 본 것입니다.
결국 공자가 말하는 애테타의 매력은 겉모습도 아니고, 갖고 있는 권력도 아니고, 특별한 무슨 사랑의 정신도 아니고, 오직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과 동화하려고 하는 물과 같은 그 모습이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중에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나한테 도움이 돼서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같이 있으면 좋은 사람이 있잖습니까?
생긴 것은 거시기하게 생겼지만 괜히 옆에 있으면 좋고 가만히 있어도 보고 싶고 하는 사람, 나에게 와서 뻐기지도 않고, 자기 잘했다고 잘났다고 하지도 않고 친구야 우리 뭐하자고 하면 그래 그러게 하자고 하며 응해주는 사람 있잖습니까?
그러게 응해 주는 사람은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물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물과 같이 이 산다는 것은 삶을 사는 지혜 중에 으뜸가는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애테타 이야기지만 잘생긴 사람은 별로잖습니까? 한번은 모르지만 매일 같이 한다면 질리지 않습니까?
너무 잘생긴 사람들은 좀 식상하지 않습니까? 필자의 경우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은 물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을 우주라는 공간에 순응하며 살고 있잖습니까?
세상의 흐름대로 나를 적응시키는 사람 그것이 말 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물처럼 산다는 것, 장자가 말하는 그런 물 같이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상 속에는 유심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유심론(사상)의 핵심은 만물을 타고 즐기라는 의미로,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며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않고, 만물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강조 합니다.
이 말을 좀 더 부연하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만상(상황)들로 그 상황을 어떡하라고 하냐면 밀쳐(거부)내지 말고 올라타라고 합니다. 상황! 그 만물을 올라타라는 말은 내게 다가오는 상황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물은 흘러가다 큰 바위를 만나면 그 바위를 거부(밀어내지)하지 않고 비껴갑니다. 결국은 상황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인정하고 순응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일)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 실패에 대해 엄청나게 화가 치밉니다. 분노가 납니다. 그랬을 때 그 실패를 그냥 실패로 받아들일 줄 아는 것 그것이 유심으로 나에게 다가온 상황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화에 올라탄다는 것 즉 순응한다는 것, 어려운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지형에 따라 물줄기를 바꾸는 물처럼, 그 상황을 인정하란 말입니다. 이것이 순응하며 순리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유심론(사상)을 더하면, 유심이라 함은 상황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내 마음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노닐라는 것입니다. 어려워지는 해석입니다. 나에게 다가온 상황을 인정한다는 것 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즉 다가온 상황을 인정하고 그것을 즐긴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4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다가 지금 망해서 13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상황까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생각)에 뭐가 남습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넓은 집 생각이 나서, 그렇지만 이럴 수밖에 없는 슬픈 상황이 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정하는 것만이 아닌 13평짜리 아파트에서 사는 즐거움을 느껴 보는 것입니다.
즉 그 상황에 올라타 노니는(적응) 것입니다. 40평짜리에서 못 느꼈던 가족 간의 정을 좁은 공간에서 서로 부비며 느껴보란 말입니다. 가족이 모이는 토요일 저녁 때 밀가루로 수제비 만들어서 가족 모두가 같이 먹어보란 말입니다. 그것이 유심인 것입니다.
유심! 상황을 타고 상황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내 마음을 얻어 노니며 새로운 즐거움을 느낄 때 그 삶이 진정한 물처럼 사는 삶(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허실편의 마지막 구절에서 강조하는 (能因敵變化而取勝(능인적변화이취승), 상대의 변화와 상황에 맞춰 승리를 얻는 조직(사람)을 귀신같은 조직(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귀신같은 사람이 돼야 합니다. 나에게 다가온 상황을 인정하고 그 상황이 성공이든 실패든 그 상황을 즐길 줄 아는, 13평의 상황이지만 그 상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야 합니다.
당연히 슬픕니다. 화장실도 좁고 모든 것이 불편하지만 13평 나름의 40평에서 느껴보지 못한 가족 간의 정(사랑)을 느낄(찾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유심하는 자세로 인생을 사는 사람, 물과 같이 주변 환경에 순응하는 흐름으로 세상에 자신을 순응시켜 살아가는 삶의 지혜 앞에는 어떠한 실패나 성공도 스스로를 자만하거나 노하게 하지 않습니다.
손자가 물에서 본 겸손함, 겸양함, 아름다움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세상(우주)에 순응(적응)해 살아가는 물과 같은 자세로 인생을 사는 방법에 대해 토파 해 봤습니다.
“손자는 물에서 무엇을 보았는가?”에 대한 각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33강에서는 “느림의 미학”에 대해서 각론 합니다. 감사 합니다.
태권도정보연구소 / 청호태권도 / 신성환 관장
태권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ttp://www.riti.net - 태권도정보연구소
http://www.ctu.ne.kr - 태권도지도자교육
http://www.taekwondoforum.net - 태권도포럼
http://www.moodotaekwondo.com - 무도태권도